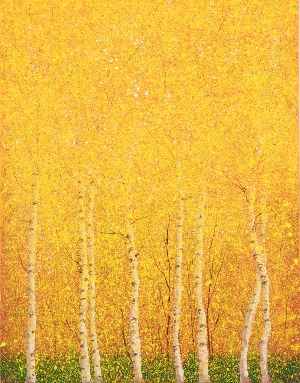티스토리 뷰
퇴사일자의 확정은 퇴직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의 발생에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통상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며, 마지막 근로일은 출근과 퇴근이 같은 날짜인 것이 일반적이다.
야간근로자는 당일 오후를 근로시작 시각으로 하여 익일 오전 근로종료 시각이므로 마지막 근로일은 출근일이 아닌 퇴근일이 되어서 통상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퇴사일자로 합의된 출근일 다음날이 마지막 근로일이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마지막 근로일이 야간근로인 경우 퇴사일 산정 : 역상계산 원칙(달력 일자 기준)
근로자의 퇴직일(퇴사일)은 "최종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날"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판례와 행정해석 모두 같은 입장이다.
예를 들어, 야간근로가 1월 31일 22:00~2월 1일 06:00인 경우, 마지막 근로일은 2월 1일로 보고, 퇴직일은 2월 2일이 되는 것이다.
<참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퇴사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즉시 수리하더라도, 퇴직일은 근로를 제공한 날 익일로 본다”(근기 68201-3970, 2000.12.22.).
퇴직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산정 관련 쟁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 ~ 마지막 근로 제공일’까지로 하며, 퇴직일(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은 산입하지 않는다.
평균임금 산정
: 산정사유(퇴직)의 발생일은 퇴직일이며, 그 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퇴직일 직전 3개월)로 나누어 계산한다.
야간근로수당
: 야간근무에 해당하는 수당(야간근로수당 등)은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 총액에 산입해야 하며,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것이 일반적이다.
문제는 야간근로로 마지막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 출근일과 퇴근일이 다르고 마지막 근로일은 퇴근일이 된다는 것이다.
연차미사용수당 산정
연차미사용수당의 산정은 퇴사 시점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연차사용청구권이 종료된 시점의 임금"이 원칙이다.
근로기간과 연차수당
연차수당 산정에 있어서 마지막 근무일(최종 야간근무일 포함)까지 근로한 기간을 포함하고, 퇴직일(즉, 근로 종료 다음날)은 제외한다.
위의 예시처럼 , 야간근로(예: 1/31~2/1)가 마지막인 경우에 2/1까지의 근속기간을 반영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한다. 특히, 1년이나 2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의 발생 여부를 좌우하게 된다.
<유의사항>
- 퇴직서 제출일과 실제 근로일이 혼동되지 않게 마지막 마지막 근로일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함.
- 급여 및 연차수당 지급일은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
- 특별합의 등으로 근로관계 종료일을 조정하는 경우 노사간 합의문서 필수.
요약하면,
- 야간근무가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에도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임.
- 퇴직금과 연차미사용수당 산정 시 실제 마지막 야간근로일(역상)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퇴직일(마직막 근로일 다음날)은 산입하지 않음.
- 야간근무수당/연장근로수당 등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 퇴직금이나 연차미사용수당 산정 시 불이익이 없도록 처리해야 함.
- Total
- Today
- Yesterday
- 고정성
- 해고
- 근로자성
- 해고 예고
- 소정근로시간
-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크다면
- 2025 통상임금 지도지침
- 절차 정당성
- https://hrmain.tistory.com/manage/newpost/?type=post&returnurl=%2fmanage%2fposts#
- 2025 고용지원금
- 법정의무교육
- 징계위원회 구성
- 휴게시간
- 해고의 정당성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
- 해고의 정당한 사유
- 징계위원회 절차
- 고용안정지원금
- 징게위원회 운영
- 징계위원회 필요성
- 해고 절차
- 성희롱예방교육
- 통상임금
- 산업안전보건교육
- 근로시간
- 임금 인상
- 직장내괴롭힘교육
- 고용창출지원금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재직자 기준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7 |
| 8 | 9 | 10 | 11 | 12 | 13 | 14 |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 22 | 23 | 24 | 25 | 26 | 27 | 28 |